선물가게를 지나, 정말 출구에 도달할 수 있을까? 뱅크시의 철학은 꽤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세상의 모든 걸 문제 삼되, 가볍게. 신성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것. 그는 늘 거리에서 익명으로 체제와 권위, 자본주의를 비틀어왔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전시장에 돈 내고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묘하게 웃기다. 아니, 좀 아이러니하다. 전시는 뱅크시의 전 매니저였던 스티브 라자리데스가 기획했다. 사실 그 자체로 뱅크시가 말해온 개인의 자유나 반체제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포스터에 큼지막하게 적힌 100% 오리지널이라는 문구는 꽤 흥미롭다. 복제 가능한 스텐실로 작업하는 작가의 전시에서 진짜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것. 이건 뱅크시가 비판해온 예술 시장의 아이러니 그 자체다. 전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 메시지는 분명하다. 꽃다발을 든 시위자는 폭력에 대한 반어고, 반복해서 나오는 쥐는 거리에서 생존하는 작고 끈질긴 존재다. 재미있는 건 Art를 재배열하면 Rat이 된다는 점이다.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이 안에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뱅크시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리고 다이애나비 얼굴이 들어간 가짜 지폐. 이건 너무 직설적이라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다. 돈, 권위, 시스템에 대한 강한 도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작품이 지금 전시장 안에서 상품처럼 진열돼 있다는 점이다. 비판을 위한 작품이 체제 안에서 팔리고 있고, 그걸 보기 위해 내가 입장료를 냈다는 사실. 뱅크시가 영화 '선물가게를 지나 출구'에서 말했던 그 모순 구조가 눈앞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가장 불편한 건 바로 내 위치다. 나는 뱅크시가 비판하는 시스템에 기꺼이 돈을 내고 들어간 소비자다. 작가는 체제를 흔들고, 기획자는 그 흔들림을 상품으로 만들고, 나는 그걸 소비한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순환 구조 안에 있다. 하지만 이 전시가 완전히 무겁기만 한 건 아니다. 중간중간 큐레이터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케이트 모스 관련된 소소한 가십들이 등장하면서, 전시가 너무 진지하거나 무겁게 흐르지 않도록 톤을 조절해준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뱅크시가 말한 태도, 진지하되 너무 진지하지 않기와 닿아 있는 느낌이다. 결국 이 전시는 굉장히 뱅크시적이다. 그가 비판해온 체제 안에서, 그의 작품이 팔리고, 소비되고,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에 도달한다는 말처럼, 이 전시는 출구인 척하면서도 사실은 또 다른 입구일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자유로운 관람자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순을 인식하는 순간, 뱅크시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신성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고, 때론 웃으며 비틀 수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뱅크시다운 저항일지도 모른다.
아트니스 - art.ness | 예술을 더 쉽고 즐겁게
Live Artfully 아트 큐레이션 플랫폼 아트니스(art.ness)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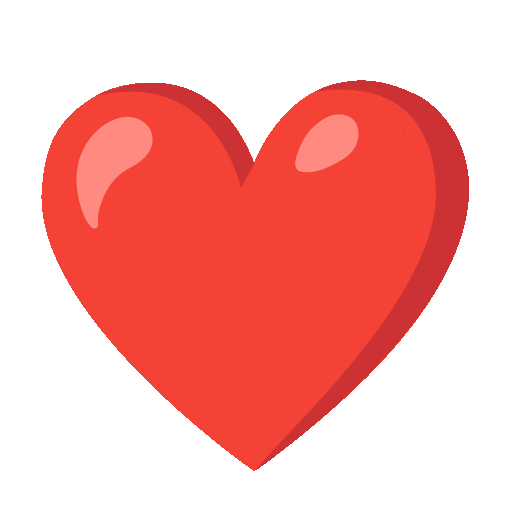 6
6 1
1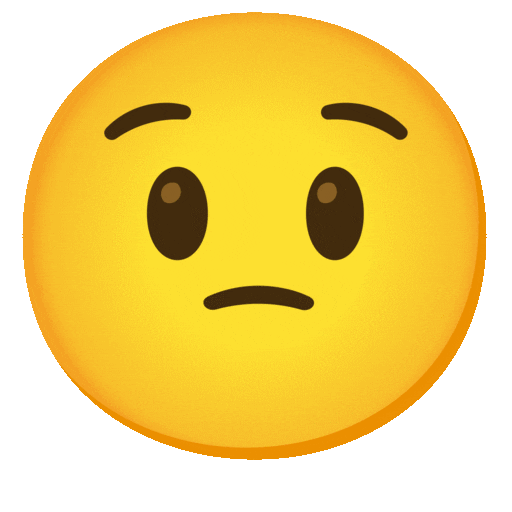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