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20일 만에 10만 명, 열흘 뒤엔 21만 명을 돌파. 현재까지 약 30만 명이 다녀간 론 뮤익 전은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단일 전시 최다 관람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이례적이고도 인상적인 숫자죠. 저는 개막 초기에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이 전시 흥행하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강렬한 시각적 자극, 또 하나는 사진 찍기 너무 좋은 전시 환경이었죠. 두 요소 모두 관람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기에 탁월했고, 특히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요즘같은 환경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느꼈어요. 론 뮤익의 작품은 익숙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감각을 자극합니다. 놀라울 만큼 사실적이지만, 오히려 그 사실성이 너무 친절해서 생각의 여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평도 있죠. 그래서 종종 “표면적이다”, “현실의 복제에 가깝다”는 비판도 따라붙는 듯해요. 이번 전시를 보며 자연스레 2024년 엘름그린 & 드라그셋의 ‘Spaces’ 전시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영장, 집, 얼어붙은 아이의 모습처럼 공간 자체가 설치물이 되어, 관람객이 그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구조였죠. 반면 뮤익 전시는 작품 하나하나의 임팩트는 강렬했지만, 전시 전체의 서사나 동선은 다소 단조롭다는 인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조로움’이 작가의 의도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뮤익은 작품의 위치, 높이, 조명 각도, 벽면 색상까지 모두 직접 디렉팅했다고 합니다. 텍스트조차도 작품 옆에 두지 않길 바랐고, 불필요한 설명이나 장치를 모두 제거한 채, 관람객이 작품과 감정적으로 일대일로 마주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시를 ‘단조롭다’고 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까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혹은 서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바라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불필요한 해설 없이도, 지금 이 시대에 현대미술의 감각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는 누구일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전시의 거시적인 면을 따라가다 보니, 개별 작품에 대한 후기는 이 글에 다 담진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선을 따라 사유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멈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론뮤익
아트니스 - art.ness | 예술을 더 쉽고 즐겁게
Live Artfully 아트 큐레이션 플랫폼 아트니스(art.ness) 예술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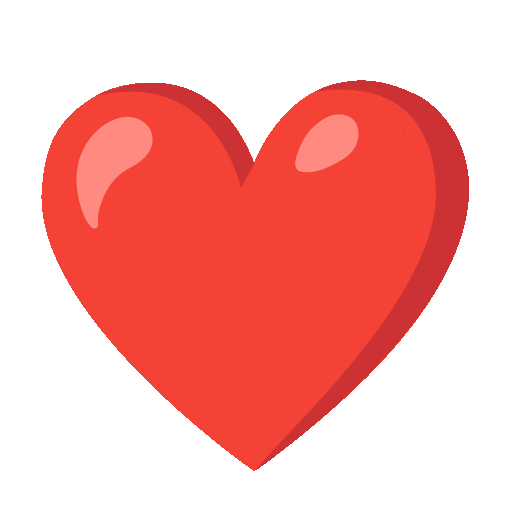 7
7